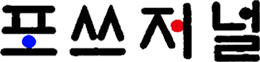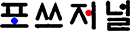[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은행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미뤄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거부 명분이 궁색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키코 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은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8일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금융위로부터 받은 키코 배상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판단한 공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피해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은행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키코 분쟁조정안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일부 은행이 키코 배상을 거부한 핵심 논리인 ‘배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의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형법상 배임 여부는 금융 관련 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며, 금융위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당시 가입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네곳에 대해 은행들이 총 255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KDB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42억원대 배상을 마쳤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키코 배상안 수용 기한을 수차례 미뤘다. 3곳의 조정안 수용 여부 회신 기한은 6월 8일이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은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제 배상 거부의 명분이 매우 궁색해지게 됐다”며 “신한은행의 적극적인 배상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배상안 수용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위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이사회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